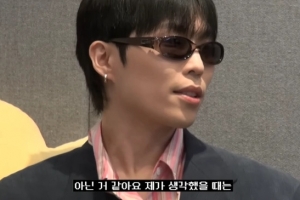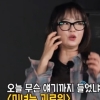‘총알 탄피 선거’에서 ‘만년인주’까지 기표용구 변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해인 1948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국민은 총 58번의 선거와 6번의 국민투표를 치르며 다양한 기표 용구를 접했다.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알 탄피로 시작된 기표용구는 대나무, 플라스틱 볼펜 자루 등을 거쳐 오늘날 만년기표봉으로 진화했다.
1980년대까지는 인주를 묻혀 투표용지에 찍었을 때 원형(○) 표시가 나타나는 대나무, 볼펜 자루 등과 같은 원통형 도구를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를 쓰는지는 지역마다 달랐다. 경기·강원 지역에서는 총알 탄피를 이용하기도 했다.
전국에서 통일된 기표용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제5공화국 때인 지난 1985년 12대 총선부터다.
1992년 제14대 대선 때부터 원 안에 ‘사람 인(人)’ 한자를 삽입했다. 잉크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접었을 때 다른 칸에 묻어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알 수 없는 사례가 이어진 탓이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2년 뒤인 1994년에는 ‘점 복(卜)’자로 바뀌었다. ‘인(人)’자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시옷’(ㅅ)을 떠올리게 한다는 일각의 주장 때문이었다.
2005년에는 인주가 필요없는 만년도장식 기표용구가 개발돼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역시 인주가 다른 칸에 묻어나 무효표 처리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이 기표용구로는 5천번을 찍을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