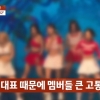정현용 메트로부 기자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다. 발품을 팔면서 시설을 찾아다니거나 전화로 문의하고 공공 예약 사이트에 등록해 두는 게 보통이다. 일단 예약 대기를 걸어 놓으면 지역에 따라 1년이나 지루하게 기다려야 한다. 대기업이 운영하거나 국공립 시설, 평판이 좋은 시설엔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너도나도 대기를 걸어 놓는다. 이때 수많은 허수가 생긴다. 실수요보다 예약 대기자가 많게는 몇 배나 많은 황당한 상황이 이어진다.
수요가 몰리는 때는 시설이 철저한 ‘갑’이며 부모는 ‘을’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입소 가능 여부를 다시 타진하거나 물러설 수밖에 없다. 성별 또는 어떤 다른 이유로 아이를 가려 받는 참혹한 현실에 부모들은 고개를 떨구기만 한다. 그나마 서울은 국공립 시설이 밀집해 한층 낫지만 맞닿은 수도권만 해도 젊은 부모들이 몰리는 반면 시설 수는 태부족이어서 발만 동동 구른다.
아이를 시설에 보내지 않고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을 들여 보육 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아이를 키우는 데 막대한 돈을 들이지만 일반 교육비와 달리 소득공제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 그래도 당장 시설에 입소하기 어려우니 한동안 도우미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한숨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아이 많이 낳자고 예산을 쏟아부으며 캠페인을 숱하게 벌이지만 그리 변화가 없는 것도 세밀한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원성의 영향도 있을 터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 부모들에겐 기다림만 있을 뿐이다.
junghy77@seoul.co.kr
2013-01-05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