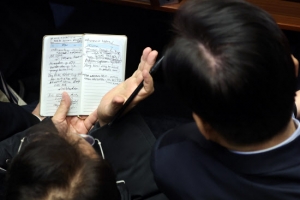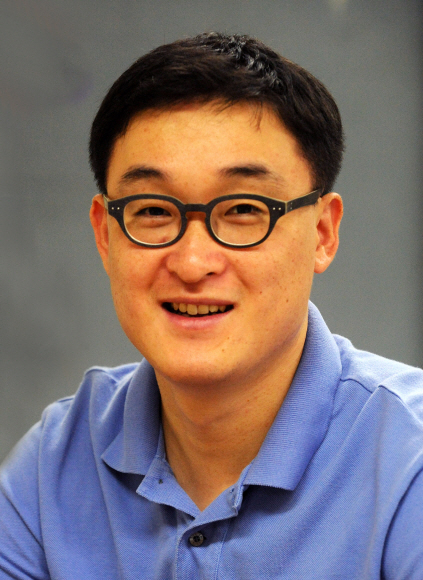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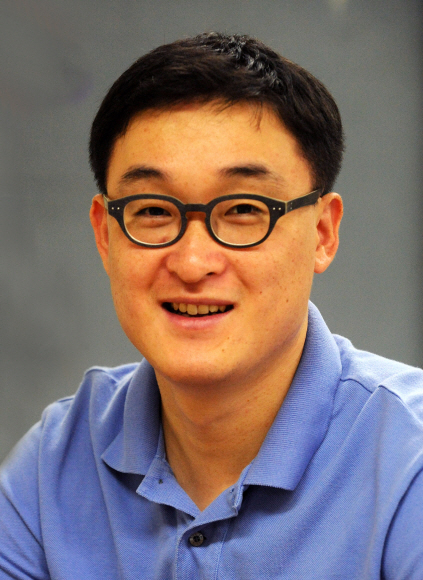
최재헌 국제부 기자
21세기 프랑스는 세계 초강대국이 됐지만 나라를 버리는 ‘비참한 사람들’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프랑스 최고부자인 루이비통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지난해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의 부자 증세를 피해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다. 올 초에는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같은 이유로 러시아 시민권을 획득했다. 국민배우로 사랑받던 그의 도피성 국적 포기에 프랑스인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비난을 쏟아냈다.
서로 다른 시대 프랑스의 ‘비참한 사람들’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아이러니하게도 150년 전의 ‘그들’은 너무 못살아서, 지금의 ‘그들’은 너무 부자이기 때문이다. 더욱 흥미롭게도 드파르디외는 프랑스 TV연속극 레미제라블에서 주인공을 맡아 열연했었다. 드라마 속에서 당대의 비극에 분노하는 장발장 역을 맡았던 그가 마침내 현실에서 뜻을 이뤘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지난 연말 뮤지컬 형식의 영화 레미제라블을 관람하면서 지금의 현실과 묘하게 겹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 한 사람의 운명을 불행으로 바꾸어 놓는 일이라든지, 아무리 발버둥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서민의 현실 같은 것 말이다. 몇몇 지인들은 대선 직후 허탈감에 빠졌던 심신을 영화로 위안 삼았다고 했다. 물론 영화 속 메시지 가운데 어느 부분에 공감했는지는 관객마다 제각각일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2013년 현재도 각 나라의 빈부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으며, 정부에 실망한 99%의 시민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150년 전 위고가 책 머리말에 적은 글귀가 문득 떠오른다. ‘이 지상에 무지와 비참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책들도 쓸모없지는 않을 것이다.’
goseoul@seoul.co.kr
2013-01-19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