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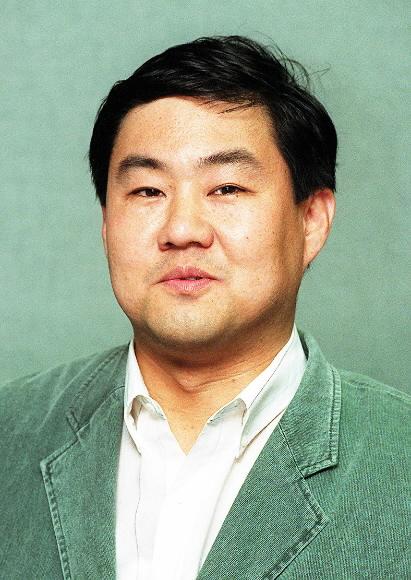
서동철 논설위원
노인 복지는 그 중요성을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분야인 것 같다.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2013년 현재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12.2%에 이른다. 노령 인구가 지난 2000년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 사회에, 2026년에는 20%를 돌파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파고다공원과 종묘공원 일대는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슬럼화가 가속화하면서 젊은이들이 외면하는 거리로 이미지가 굳어져 가고 있다. 국가가 이토록 노인들을 외면하는 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일 아닌가 생각한다. 노인 세대가 가진 정치적 잠재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노인 세대의 정치적 파워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노령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노인 유권자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 유권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노인층이 각종 선거의 판도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미래로 갈 것도 없이 지난해 대선 역시 야권 후보의 분열보다는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외려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인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쳐놓는 정당이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집권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봐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들고 나온 것은 이런 흐름을 읽었기 때문일 것이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및 액수의 조정이 정치 쟁점화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물러나는 등 논란을 빚고 있지만 2014년 7월에는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기초연금에 반발하는 민주당도 기존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개선해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누구의 법이 근거가 되든 부족한 대로 끼니를 거르는 노인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인 문화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면서도 말하지 못한 것은 일단 노인들이 배를 곯지 않게 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먹는 문제가 최소한이라도 해결된 다음 단계의 노인 복지는 당연히 문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즐거움을 느끼며 그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면 족할 것이다. 수천명의 노인이 모여들지만 장기판 말고는 문화가 없는 파고다공원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노인은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에서는 소외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일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국에 226개뿐, 한 시·군·구에 한 곳꼴도 되지 않는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 복지의 목표라면 노인 복지 역시 복지의 문제이자 문화의 문제이다. 문화융성위원회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문화정책의 기조 역시 ‘문화가 있는 삶’이 아닌가.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노인들의 삶에도 문화정책적 차원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dcsuh@seoul.co.kr
2013-11-2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