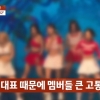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봉사가 아니라 환자들과 함께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시간을 나눌 뿐인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환자들이 좋아하니 자신도 행복해진다고 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부모님 생각이 난다. 생판 모르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시간을 내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자괴감이 들었다. 근처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은 80대 중후반에 몸도 아프시다. 한데 일주일에 한번은 찾아뵙기나 하는 걸까. 뵙는 시간도 1시간 남짓이다. 조금만 오래 있으면 엉덩이가 들썩거린다.
그뿐이 아니다. 친지나 동료의 경조사에도 부조금만 보낸 적이 많았다. 시간이 없다는 건 대부분 핑계였다. 가게 되면 음식만 축낸다고 자위하기도 했다. 내 탓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든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생산성을 강조하는 사회는 시간을 나누는 데 인색하다고 한다. 노인들도 덜 공경한다고 한다. 어찌됐든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부터 늘려야 하지 않나 싶다. 한데 그럴 수 있을까?
황진선 특임논설위원 jshwang@seoul.co.kr
그뿐이 아니다. 친지나 동료의 경조사에도 부조금만 보낸 적이 많았다. 시간이 없다는 건 대부분 핑계였다. 가게 되면 음식만 축낸다고 자위하기도 했다. 내 탓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든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생산성을 강조하는 사회는 시간을 나누는 데 인색하다고 한다. 노인들도 덜 공경한다고 한다. 어찌됐든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부터 늘려야 하지 않나 싶다. 한데 그럴 수 있을까?
황진선 특임논설위원 jshwang@seoul.co.kr
2011-01-2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