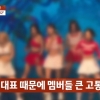부고 소식을 듣고 달려간 장례식장에서 상주인 친구와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친구 엄마는 요양원과 병원을 오가는 오랜 투병생활 끝에 지난 주말 영면에 드셨다. 딸만 셋인 집안의 맏딸로서 친구는 그간 맘고생, 몸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간의 어려움을 얘기하다가 대뜸 이 말을 꺼냈다.
‘선재 업고 튀어’라는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남자 주인공의 매력에 빠져든 여심이 엄청나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런데 고인을 추모하던 그 상황에서 드라마 얘기를 들을 줄이야. 간병생활의 스트레스를 ‘선재’를 보며 풀었다니 엄숙해야 할 장소에서 그만 크게 웃고 말았다.
폐암 투병 중 ‘욘사마’에게서 위로를 받은 일본 작가 사노 요코가 떠올랐다. 그녀의 유작 ‘죽는 게 뭐라고’에는 소파에 누워 거의 하루 종일 ‘겨울연가’를 보며 고통과 우울을 잊는 대목이 나온다. 선재든 욘사마든, 아프고 고단한 시간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환상의 존재는 늘 필요하다.
2024-06-2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