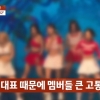새해 들어 이동통신업계가 솔깃한 마케팅 하나를 시작했다. 출고가가 88만원인 갤럭시노트3를 공짜폰으로 내놓았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묶여 쥐꼬리만 한 지원금(이통사 평균 28만 4000원)을 받아 온 터여서 상당한 관심권에 있다. 이 폰은 출시된 지 15개월을 넘겨 최대 지원금 30만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다 대리점 지원금 15%를 더하는 등으로 공짜 수준에 살 수 있다. KT는 88만원, SK텔레콤은 72만 5000원, LG유플러스는 6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업체들은 공짜폰을 왜 내놓았을까. 최신폰에는 법정지원금만을 허용하니 신형과 성능이 비슷한 단말기에 적용한 것이다. 대신 8만~9만원대 요금제를 써야 한다. 알려진 대로 공짜폰 가치만큼의 요금을 다달이 내는 구조다. 업체들의 고심 흔적이 역력하다. 법인폰이나 무제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이득이 있다고 보았다. 문제는 요금제가 꽤 비싸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3~6개월만 지나면 위약금을 내지 않고 싼 요금제로 옮길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모르거나 게을러 저가 요금제로 갈아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단통법이 아니라 ‘단촉법’(구형단말기 소비촉진법)이라고 비아냥댄다. 유통 구조가 왜곡됐다는 말이다. 이 틈새시장 마케팅이 안착할지는 시장에서 결정될 문제다.
단통법 시행 100일(8일)을 맞았다. 그동안 실패한 정책이니, 안착하고 있다느니 논란을 거듭 쏟아냈다. 지난해 11월 초에는 기습적으로 불법지원금을 뿌린 ‘아이폰6 사태’도 겪었다. 다만 정부가 엊그제 내놓은 단통법 시행 3개월 성적표는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다. 초기에 얼었던 시장은 기지개를 켜고 있고, 고가에서 중저가(3만~5만원대)로의 요금제 이동도 확연하다. 저가폰인 알뜰폰 가입자도 458만명(점유율 7.9%)에 이른다. 매달 10만~17만명이 늘어나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할 정도가 됐다. 가계의 통신요금 부담도 다소 덜어졌다. 자의든 타의든 중저가 요금제를 찾고 불편 없이 쓴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누구를 위한 법이냐”며 비난이 쏟아졌던 초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시장 안착을 논하는 건 이른 감이 있다. 일반 소비자의 반응은 아직 뜨뜻미지근하다. 불법지원금 살포 등 머리 좋은 업체의 꼼수가 나타날 우려도 상존한다. 단말기 출고가에는 여전히 거품이 끼어 있다. 요금도 더 내려야 한다. 지원금 상한제는 3년이 지나면 없어진다. 이때까지 왜곡된 유통 구조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 시장의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소비자는 영원한 ‘호갱’(어수룩한 고객)일 수밖에 없다. 이통업계의 노력도 요구된다. 업체들은 갤럭시노트3를 공짜폰으로 내놓으면서 “대리점 등 시장에 이미 뿌려진 제품을 소비시켜야 그 다음에 출고가를 낮출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미끼 말이 아니라 진짜이기를 바란다.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업체들은 공짜폰을 왜 내놓았을까. 최신폰에는 법정지원금만을 허용하니 신형과 성능이 비슷한 단말기에 적용한 것이다. 대신 8만~9만원대 요금제를 써야 한다. 알려진 대로 공짜폰 가치만큼의 요금을 다달이 내는 구조다. 업체들의 고심 흔적이 역력하다. 법인폰이나 무제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이득이 있다고 보았다. 문제는 요금제가 꽤 비싸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3~6개월만 지나면 위약금을 내지 않고 싼 요금제로 옮길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모르거나 게을러 저가 요금제로 갈아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단통법이 아니라 ‘단촉법’(구형단말기 소비촉진법)이라고 비아냥댄다. 유통 구조가 왜곡됐다는 말이다. 이 틈새시장 마케팅이 안착할지는 시장에서 결정될 문제다.
단통법 시행 100일(8일)을 맞았다. 그동안 실패한 정책이니, 안착하고 있다느니 논란을 거듭 쏟아냈다. 지난해 11월 초에는 기습적으로 불법지원금을 뿌린 ‘아이폰6 사태’도 겪었다. 다만 정부가 엊그제 내놓은 단통법 시행 3개월 성적표는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다. 초기에 얼었던 시장은 기지개를 켜고 있고, 고가에서 중저가(3만~5만원대)로의 요금제 이동도 확연하다. 저가폰인 알뜰폰 가입자도 458만명(점유율 7.9%)에 이른다. 매달 10만~17만명이 늘어나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할 정도가 됐다. 가계의 통신요금 부담도 다소 덜어졌다. 자의든 타의든 중저가 요금제를 찾고 불편 없이 쓴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누구를 위한 법이냐”며 비난이 쏟아졌던 초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시장 안착을 논하는 건 이른 감이 있다. 일반 소비자의 반응은 아직 뜨뜻미지근하다. 불법지원금 살포 등 머리 좋은 업체의 꼼수가 나타날 우려도 상존한다. 단말기 출고가에는 여전히 거품이 끼어 있다. 요금도 더 내려야 한다. 지원금 상한제는 3년이 지나면 없어진다. 이때까지 왜곡된 유통 구조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 시장의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소비자는 영원한 ‘호갱’(어수룩한 고객)일 수밖에 없다. 이통업계의 노력도 요구된다. 업체들은 갤럭시노트3를 공짜폰으로 내놓으면서 “대리점 등 시장에 이미 뿌려진 제품을 소비시켜야 그 다음에 출고가를 낮출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미끼 말이 아니라 진짜이기를 바란다.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5-01-0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