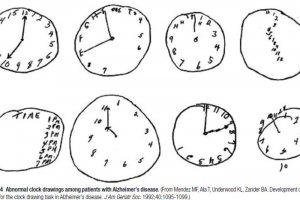얀 마텔 9년만의 장편소설 ‘베아트리스와 버질’
소설의 운명이 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2002년 ‘파이 이야기’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얀 마텔은 이 같은 물음에 “반은 작가의 몫이고, 반은 독자의 몫이다. 독자가 소설을 읽음으로써 작품은 하나의 인격체로 완성된다.”고 말한다. 이런 바탕에는 인간의 본질이라는 무거운 공통분모가 깔려 있다. 41개국어로 번역된 ‘파이 이야기’ 이후 9년 만에 침묵을 깨고 새로 선보인 장편소설 ‘베아트리스와 버질’(강주헌 옮김, 작가정신 펴냄)에서도 마텔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해 온 끈질긴 집념을 깔면서 ‘파이 이야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독창적인 우화형식을 빌려 흥미롭게 전개해 나간다.
전작 ‘파이 이야기’가 난파된 배에서 살아남아 태평양 한가운데를 표류하는 소년과 호랑이의 공존을 그렸다면 이번에는 당나귀 베아트리스와 원숭이 버질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나치에 의해 자행된 학살, 즉 홀로코스트를 상징적으로 그려 나간다.
왜 그는 홀로코스트에 동물들을 등장시켰을까. 아마도 동물의 입을 빌려 인간의 추악한 만행을 더 강렬하게 표현하고자 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간다.
번역을 맡은 강주헌은 “마텔이 동물의 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간단하다. 우리가 인간의 목소리에는 냉소적인 반응을 띠더라도 똑같은 이야기가 동물의 입을 통해 전해질 때는 사뭇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작가는 ‘파이 이야기’와는 달리 박제된 동물을 등장시킨다. 그것도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두 주인공 ‘베아트리체’(영어식으로는 베아트리스)’와 ‘베르길리우스’(영어식 버질)라는 안내자의 이름으로.
소설 속의 화자(話者) 헨리는 작가 마텔을 연상시킨다. 동물 소설로 큰 명성을 얻은 헨리는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방식이 아닌 상상력을 동원한 비유의 방식으로 홀로코스트를 다룬 소설을 완성하지만 책으로 펴내기도 전에 혹평을 받고 글 쓰기를 그만둔 채 익명으로 살아간다.
어느 날 그에게 의문의 소포가 배달된다. 그 속에는 당나귀 베아트리스와 원숭이 버질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미완성 희곡 ‘20세기의 셔츠’가 들어 있다. 헨리는 희곡을 쓴 사람을 찾아간다. 한 뒷골목에서 박제상점을 하는 노인을 만나고, 희곡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박제된 당나귀와 원숭이도 보게 된다. 이때부터 박제사 노인의 말을 들으며 헨리가 희곡의 완성을 돕는다는 것이 책의 줄거리.
마지막에 이르러 작가는 ‘구스타브를 위한 게임’을 제시한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질문이 12번째까지 계속되다가 13번째의 질문은 빈칸으로 남겼다. 왜? 소설의 운명에는 독자들의 몫이 있기 때문이다. 1만 2000원.
김문 편집위원 km@seoul.co.kr
2011-03-1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