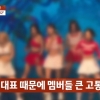피아니스트 피르스 새달 내한
한국 클래식 팬도 딱 한 번 그녀를 볼 기회가 있었다. 17년 전.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네덜란드의 로열 콘세르트허바우와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27번을 들려줬다. 물론, 1990년대 후반의 세종문화회관 음향 조건은 모차르트 전문가로도 역부족이었을 터. 연주자와 관객 모두 진한 아쉬움을 남긴 채 세월이 흘렀다. 포르투갈 태생의 여성 피아니스트 마리아 주앙 피르스(69)의 얘기다.

피아니스트 마리아 주앙 피르스
피르스는 최근 이메일 인터뷰에서 “하이팅크와는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협연했는데 믿기 어려운 경험이었다. 리허설을 할 때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공연에서는 엄청난 집중력으로 강렬하면서도 자유로운 연주를 하도록 만들었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로 불리는 데 대해 “날 오로지 모차르트와 결부지으려는 시각은 사양하겠다. 모차르트를 연구하고 준비했던 것과 똑같은 시간과 노력만큼 다른 작곡가에 대해서도 쏟아부었다”고 답했다.
피르스는 1980년대 손목 부상으로 한동안 쉬었고, 2006년 심장수술을 받은 뒤로는 포르투갈을 떠나 브라질에 정착했다. 음악을 통해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돕고 싶어한 피르스는 포르투갈의 시골지역에 벨가이스 문화센터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의욕을 불살랐다. 하지만 2006년 포르투갈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빚을 떠안고 손을 뗐다. 그는 “(2006년) 당시 자신을 너무 혹사했다”면서 “그때 이후 교훈을 얻었다. 음악만큼 인생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피르스는 연주회에서 화려한 드레스는커녕 삼베나 면직물 소재의 환경친화적인 옷을 즐겨 입고, 화장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불교에 관심이 많다. 피르스는 “독실한 신자는 아니다”면서도 “서울에서 시간을 내 사찰 경내를 산책하고 싶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악장 사이에 손뼉을 치지 않았으면 한다. 고요함 속의 평화를 청중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01-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