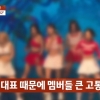박연준


설을 맞아 생각해 본다. 올해는 뭔가를 끊으려고만 말고, 안 하던 일을 해 볼까. 싫어하는 것의 목록을 늘리지 말고 좋아하는 것의 목록을 늘려 볼까. 아끼지 말고 헤퍼져 볼까. 매사에 조심스럽게 말고, 우당탕탕! 소란스러워져 볼까. 할 일을 또박또박 하지 말고, 하지 않아도 될 일만 찾아서 해 볼까. 짜릿하다. 작심삼일이라지만 작심(作心)은 얼마나 귀한 마음이며, 삼일(三日)은 얼마나 충분한 시간인가!
사실 무언가를 끊거나 바꾸는 일은 전부터 내가 수시로 시도해 온 일이다. 중독이 의심되어 작년 봄에 스마트폰을 폴더폰으로 바꿨다. 날마다 몇 잔씩 마시던 커피를 두 달 동안 끊고(이게 가장 힘들었다!), 얼마 전엔 인스턴트 음식과 설탕 함량이 많은 디저트를 끊었다. 요즘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30분짜리 모래시계를 놓고 훈련 중이다. 모래알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30분 동안은 절대 하던 일을 멈추지 않기, ‘딴짓 않기’가 규칙이다. 모래시계를 뒤집어 가며 일하다 보면 나중엔 모래시계를 잊고 집중하게 된다. 고요히 떨어지는 모래를 보고 있으면 숨어 있던 시간의 속살을 보는 것 같아 오싹하다. 지금도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고 이 글을 쓰는 중이다. 자아 단련을 위해서라지만 스스로에게 너무 인색하게 굴었나?
더 할까, 덜 할까 그것이 문제로다. 김현승 시인은 “파도가 될 것인가 / 가라앉아 진주(眞珠)의 눈이 될 것인가”라고 노래했다. 나는 진주도 아니면서 가라앉은 보석 흉내를 내느라 애써 왔는지도 모른다. 한편 솟구치는 파도가 되기 위해선 얼마나 까치발을 서고 점프를 해야 할까. 애쓰지 말자. 설렁설렁 해찰을 하며 살자. 올해의 원대한 목표로 정해 두었는데 자꾸 잊는다. 나는 진주도 모르고 파도도 모르니, 그냥 나다운 상태로 꾸준하고 소소하게 빛났으면 좋겠다. 몸에 마음을 가져다 댈 때 그 ‘꼭 맞음’의 느낌으로. 허리가 구부러질 때 마음이 허리에 가 같이 구부러지고,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땐 마음도 손에 가서 얼른 잡히는, 몸과 마음이 따로 놀지 않는 상태로 지내면 좋겠다.
올 설에도 여전히 나는 (팔자 좋게도)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집에서 보낼 것이다. 떡국을 끓이고 잡채와 갈비찜을 만들고, 동그랑땡은 반찬가게에서 사 올 것이다. 명절 음식을 먹으며 금세 질리겠지. 며칠 동안 기름진 음식을 먹으니 역시 물리는군. 새콤한 동치미를 떠먹고 싶군. 그러다 정색하고 존 버거의 문장을 곱씹어 보겠지. “음식도 일종의 전언(傳言)이다. 먹는다는 것은 전갈을 받는 것이다. 누가 어디로부터 보낸 전갈인가?” 먼 곳에서 이쪽으로 전갈을 보낸 사람들을 생각해 보겠다. 잘생긴 당근을 보며 놀라야지. 당근아, 너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구나. 흙 망토를 두르고 있는 여왕 같아. 양배추야, 너는 한 겹 한 겹 뜯기지만 뭉쳐 있을 땐 무기처럼 단단해. 대단하구나! 하지만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 속으로만 외치겠다.
공책에 ‘할 생각이 전혀 없던 일’, 혹은 ‘싫어하는 일 좋아하기’ 목록을 만드는 것도 재미있겠다. 먼저 떠오른 건 내가 싫어하는, ‘바퀴벌레 사랑하기’인데 차마 못 쓰겠다. 이건 패스. 스노보드 타기, 삐삐처럼 무릎까지 오는 짝짝이 양말 신고 친구 만나기, 동네 할머니랑 친구 되어 보기는 어떨까. ‘숨은그림찾기’를 만들어 인생이 한없이 지루하단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에게 줘 볼까. 존경하는 스승에게 덕담은 괜찮으니 세뱃돈 주세요, 생떼 부려 볼까. 날 이상하게 보겠지…. 노다지다! 날마다 재미있는 일을 찾아보자.
모래시계를 뒤집으며 생각한다. 설 지나면 어때. 밤이 지나면 늘 새 날이 기다린다. 정월 초하루도 숱한 날 중의 하루일 뿐. 달마다 초하루를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겐 매 달 열한 번의 초하루가 남아 있다. 변신로봇처럼, 자꾸 변신을 꿈꾸는 자에겐 기회가 많다. 올해 설날은 갓난아이가 맞은 인생 첫날처럼 맞이하자. 해 보자. 처음처럼 아니라, 진짜 처음 하는 일을!


박연준 시인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나 동덕여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2004년 중앙신인문학상에 시 ‘얼음을 주세요’가 당선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스물 다섯 살 차의 장석주 시인과 나이를 뛰어넘은 ‘시인 부부’로 유명하다. 시집 ‘속눈썹이 지르는 비명’, ‘아버지는 나를 처제, 하고 불렀다’, ‘베누스 푸디카’, 산문집 ‘소란’, ‘우리는 서로 조심하라고 말하며 걸었다’, ‘내 아침인사 대신 읽어보오’가 있다.
2019-02-01 6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