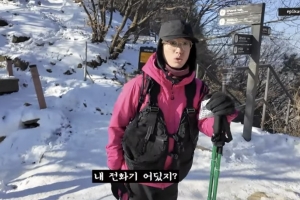‘사서 고생’ 록 페스티벌 지고 ‘피크닉형’ EDM 축제가 대세
획일화된 콘셉트, 관객 외면
울트라 코리아 제공

여름 축제를 대표했던 록 페스티벌의 위상이 흔들리는 사이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 페스티벌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사진은 이달 초 열린 EDM 페스티벌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의 공연 모습.
울트라 코리아 제공
울트라 코리아 제공
한국 음악 페스티벌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 아니 터놓고 말하면 바뀌기 시작한 지는 꽤나 오래됐고 이미 한 차례 체질을 바꾼 뒤 동체를 재구성 중이라는 표현이 맞겠다. 기점은 2013년 즈음이었다. 1999년 인천 송도에서 ‘트라이포트 록 페스티벌’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대형 음악 페스티벌 시장은 이후 끊이지 않는 악천후, 좀처럼 흑자로 돌아서기 힘든 구조 등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덩치를 불려 갔다.
2013년과 2014년은 대형 페스티벌 붐이 일었던 시기였다. 어렵사리 명맥을 이어 나가고 있는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2006년 출범)과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2009년 출범), 현대카드 주최의 ‘시티 브레이크’ 등 수도권에서만 무려 5개의 대형 음악페스티벌이 범람했다. 모두 흥행을 위해선 10만명 이상의 관객 동원이 필요한 규모의 페스티벌이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국내에서 좀처럼 주류의 깃발을 차지하지 못한 록 음악과 ‘장화는 필수, 우비는 선택’으로 요구되는 ‘사서 고생형’ 페스티벌을 매주 찾을 만한 페스티벌 마니아의 숫자는 많지 않았다. 국내 관객의 성향마저 도심형, 일상형, 피크닉형으로 진화하던 참이었다. 불과 2, 3년 사이에 대부분의 페스티벌이 문을 닫았다. 올해 개최를 확정한 건 인천 송도의 펜타포트가 유일하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 대부분의 공연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고 입을 모은다. ‘사람이 모인다’는 소문만 듣고 뛰어든 사업자들이 당시 급변하던 시장 상황에 대해 고민과 분석을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다. 이 밖에도 대형 음악 페스티벌이 국내 시장에서 쇠퇴하게 된 원인은 다양하다. 그 가운데 가장 자주 꼽히는 건 록 음악의 인기 하락이다.
한때 대형 음악 페스티벌이라면 자연스레 ‘록 페스티벌’을 연상하던 시절이 있었다. 주최 측과 관객이 하나로 마음을 모아 라디오 헤드, 콜드 플레이 등 세계적인 록 스타들을 헤드 라이너로 세우기 위해 밤낮으로 공을 들이던 시기였다.
이 분위기가 바뀌기까지 채 10년이 걸리지 않았다. 지난 수년간 마니아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회자돼 온 미국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의 올해 헤드 라이너는 더 위켄드, 비욘세, 에미넴 등 블랙 뮤직 음악가 일색이었다. 국내 상황 역시 라인업 발표와 함께 각종 음악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만든 건 체인 스모커스, 데이비드 게타 등 EDM 스타들의 이름이었다. 유일하게 1차 라인업을 공개한 펜타포트의 경우 인더스트리얼 록의 전설인 나인 인치 네일즈와 활동을 중단한 린킨 파크의 멤버 마이크 시노다의 이름을 내세웠다. 안타깝게도 모두 전성기가 10년 이상 지난 음악가들의 이름이었다.


김윤하 대중음악평론가
대중음악평론가
2018-06-19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