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도통신 기자 출신의 작가 15개국 떠돌며 ‘食·生 현장’ 전달
먹는 인간/헨미 요 지음/박성민 옮김/메멘토/364쪽/1만 6000원
메멘토 제공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주민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저자.
메멘토 제공
메멘토 제공
교도통신 외신부 기자인 저자는 어느 날 기사 몇 줄로 세상을 해석하는 데 염증을 느낀다. 방글라데시, 베트남, 크로아티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티오피아, 우간다, 한국 등 15개 나라를 떠돌며 ‘식’(食)과 ‘생’(生)의 현장을 찾아 나선다. 포식에 길들여져 아무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의 혀와 위장을 반성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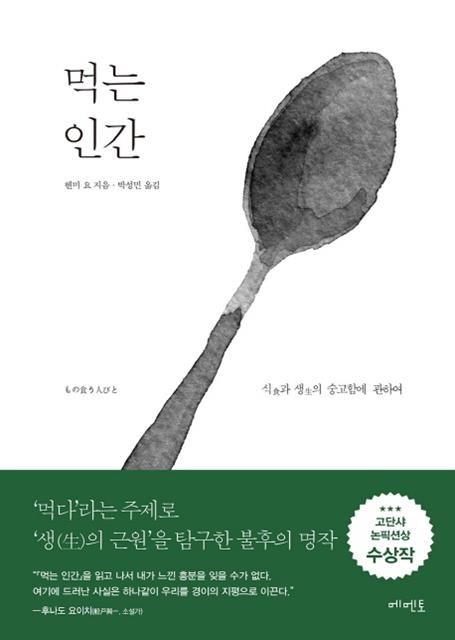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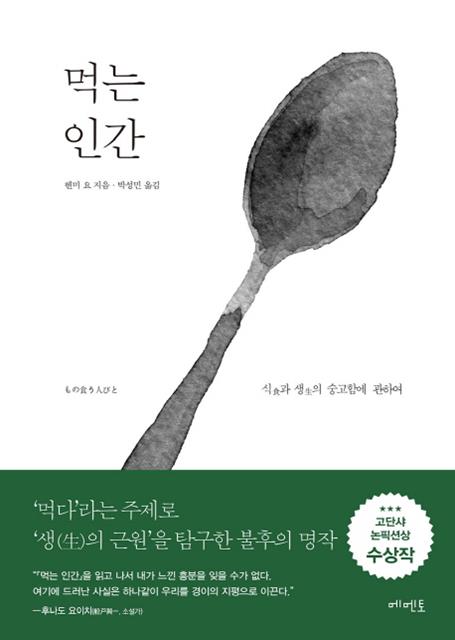
이야기는 고매하지도 거룩하지도 않다. 오감을 느끼며 먹는 행위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간직된 이야기는 아프고 슬프고, 폭력적인 동시에 존재들이 뿜어내는 역사의 발화다.

메멘토 제공

1994년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의 부모님 묘소 앞에서 통곡하고 있다. 저자는 수많은 일본 병사들에게 유린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로 위로했다고 전했다.
메멘토 제공
메멘토 제공
열여덟 살 나이에 미얀마의 ‘랑군 군인 위안소’에서 미쓰코로 불린 김복선 할머니는 하루 20~30명의 일본군에게 범해졌다. “매일 강가에서 (콘돔을) 씻었어. 모두 웅크리고 앉아서. 괴로웠지. 한심했어.” 그녀에게 유일한 음식의 기억은 끌려가던 중 일본 오사카의 포장마차에서 허겁지겁 먹은 ‘우동’이 전부다. 요시코로 불린 문옥주 할머니는 랑군에서 일본 병사가 던져 준 꽁치 통조림 한 통을 떠올린다. 채소를 얹어 위안소 여자 열 명이 나눠 먹은 한 통의 통조림을 “맛있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부모님의 묘소 앞에서 “엄마…엄마…”를 부르며 끝없이 오열하는 이용수 할머니의 처절한 상처를 목격한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난이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의 비참함과 같이 보여도 하나하나 세세하게는 역시 자기 자신만의 것”(337쪽)이라는 걸 깨닫는다.

메멘토 제공

1986년 4월 원자로 폭발 사고로 폐쇄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에서 20㎞ 떨어진 일리옌치 마을의 한 노파가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로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메멘토 제공
메멘토 제공
책은 세계 도처에서 ‘먹는 인간’과 ‘먹는 행위’의 광경들을 관능적으로 그려 낸다. 저자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이 책은 고단샤 논픽션상을 수상하며 비평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7-03-1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