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여덟 번째 시집 ‘충만한 사랑’ 펴낸 김남조 시인
“나는 만년의 으스름 저문 날을 살면서도, 보고 느끼고 깨닫고 감동하는 바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삶의 본질, 그 의미심장함과 이에 응답하는 사람의 감개무량함, 살아가면서 더디게 성숙되어 가는 경건한 인생관, 이 모두 오묘한 축복이며 오늘 우리의 감사이자 염원입니다.”

김남조 시인
구순에 이르러서도 시인은 매일 감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10년 전부터는 시 쓰기를 중단하고 다른 이의 글이나 읽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1953년 첫 시집 ‘목숨’ 이후 64년째 이어온 시업은 그에게 여전히 ‘충만한 사랑’이다. 시인은 그래서 고백한다.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면 자꾸만 마음속에서 시심(詩心)이 일어나고, 또 시구가 떠올라서 시 쓰기를 멈출 수 없었다”고. 최근 열여덟 번째 시집 ‘충만한 사랑’(열화당)을 펴낸 김남조(90) 시인 얘기다.
‘심장이 아프다’ 이후 4년 만에 펴낸 새 시집에는 지난 4월 정지용문학상을 받은 ‘시계’ 등 신작 63편을 담았다. 노경에 이르러 시간 앞에 고백하고 참회하는 시인은 인간의 속됨을 반성하면서도 이상을 향해 분투하는 의지를 긍정한다.
‘그대의 나이 구십이라고/시계가 말한다/알고 있어, 내가 대답한다/시계가 나에게 묻는다/그대의 소망은 무엇인가/내가 대답한다/내면에서 꽃피는 자아와/최선을 다하는 분발이라고/그러나 잠시 후/나의 대답을 수정한다/사랑과 재물과/오래 사는 일이라고//시계는 즐겁게 한판 웃었다/그럴 테지 그럴 테지/그대는 속물 중의 속물이니/그쯤이 정답일 테지…/시계는 쉬지 않고/저만치 가 있다’(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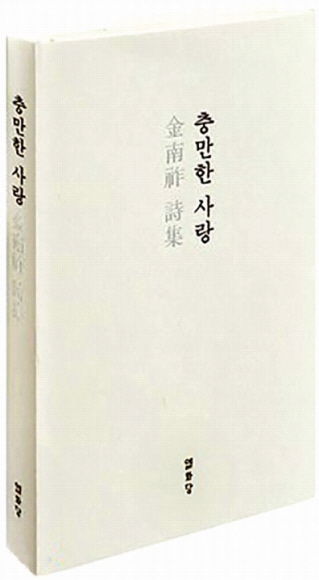

쓰다 버린 시구절들을 돌이키면서는 ‘관절이 삐걱거려 피와 살을 입혀 주지 못한’ 생애를 떠올린다. 그러면서 ‘나 역시도 누군가의 실패한 문장’일 수 있음을 토로한다. 하지만 소란, 어지러움, 적막이 혼재하는 삶마저도 긍정하는 시편에서는 그의 영원한 주제(사랑과 구원)가 찬미가처럼 울린다.
‘세상이 적막해진다/적막의 병정들이/구름처럼 몸 부풀리면서 온다/아니다/고요함은 탁월한 능력/사람은 소란으로 가득 차 있어/어지럽다/사람은 어지럽다 맞다/사람에겐 은총이 있다/못다 부른 긴 악보의 찬미가가 있다/조물주와 피조물주 사이/전류가 흐른다 맞다//사람에겐 주야로 고여 오는 눈물이 있다/사람은 측은한 존재이다/측은하다 맞다/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난 일/한 번쯤은 나쁘지 않다/맞다 맞다’(사람 이야기)
그에게 ‘심각한 시’는 고통이나 소통 불가의 언어가 아니다. ‘밤과 새벽 사이의/어둠이자 빛이다/처음 듣는 신선한 독백이며/문 앞에 와 있는/영혼의 첫 손님이다’(심각한 시) 그래서 시인은 소망한다. “가능하다면 이후에 또 한 권의 시집을 펴내고 싶다”고.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7-10-1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