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자상함, 먼저 베푸는 호의…감정의 빚 만들어 거절 땐 스토킹도
서늘한 신호/개빈 드 베커 지음/하현길 옮김/청림출판/456쪽/1만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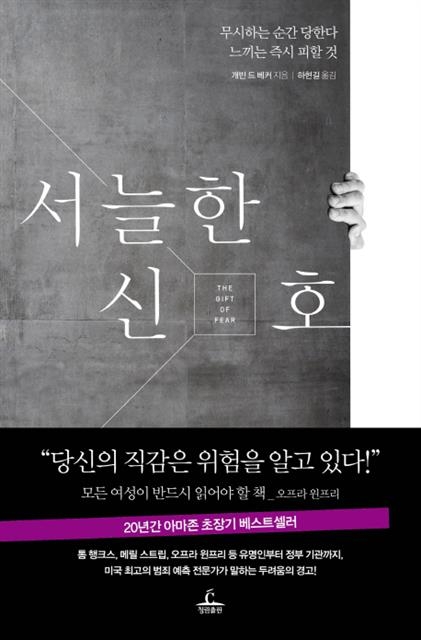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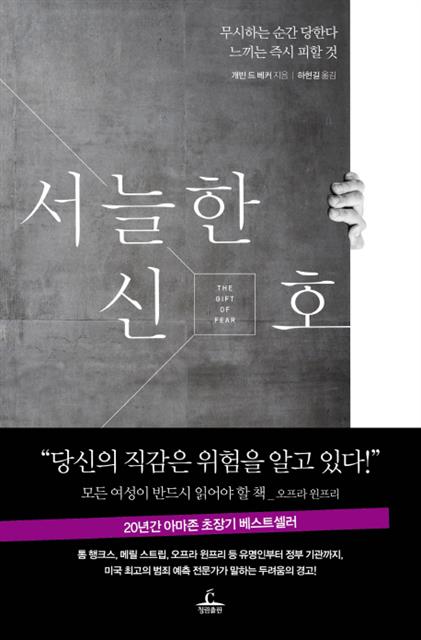
‘서늘한 신호’는 우리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협박, 폭력, 강간, 살인과 같은 각종 범죄를 다룬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어떤 신호가 있으며, 누구나 이를 알아차릴 직관이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는 명확한 이론이나 과학적인 실험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맡았던 사건이나 상담 사례를 분석했다. 학대받는 여성이 ‘다시 돌아가면 남편이 잘 대해 주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해 다시 돌아갔다가 살해당한 사례, 우연히 사업 제안을 받고 나서 단호히 거절하지 못해 협박을 받게 된 사례, 우편물 폭탄으로 의심되지만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가 참혹한 결말을 맞은 사례 등 생생한 사례들이 담겼다.
저자는 우리에게 범죄의 신호를 잘 살피고, 직관에 좀더 귀를 기울이라고 말한다. 예컨대 브라이언처럼 스토커가 될 수 있는 남자들은 “아니요”라고 말하기 어려워하는 여자를 먹잇감으로 고른다. 지나칠 정도로 자상함을 보이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도움을 베푸는 식으로 여성에게 ‘감정의 빚’을 만들어 거절하지 못하게 한 뒤, 고리대금업자처럼 접근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여성의 뜻과 상관없이 동거나 결혼 등을 요구하고, 여성이 두려움을 느껴 이를 거절했을 때에는 정신없이 몰아치고 잔혹한 범죄까지 저지른다.
이들에게 대처하는 실제 방안은 특히 눈여겨볼 부분이다. 캐서린은 브라이언이 33번째 걸었던 전화까지 참다 결국 받은 뒤 말싸움을 했는데, 이는 사건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전화를 피하려고 전화번호를 바꾸기보다 우선 새 전화번호를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만 알려주고, 브라이언이 지칠 때까지 이전 번호로 전화하게 하는 게 더 유용하다고 조언하는 식이다.
저자는 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를 총으로 살해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동생이 잔혹하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등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다. 자신의 경험을 남들이 겪지 않도록 관련 분야에서 일하면서 폭력 예측 및 관리에 관한 미국 최고 전문가가 됐다. 1980년 레이건 대통령팀의 초청인사를 경호하는 ‘특별서비스조직’ 책임자로 임명된 이후 미국 국무부에서 일하며 한국 대통령, 영국 총리, 스페인 왕 등의 공식적인 방문 경호를 담당했다. 미 법무부 대통령자문위원, 유명 인사들의 스토커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의 수석자문관 등으로 일했다.
책은 2003년 출간한 ‘범죄신호’(황금가지)에서 삭제된 부분을 다시 보강하고 오역을 정리해 최근 새로이 출간했다. 출판사 측은 “책이 절판되고 나서도 책을 찾는 독자들이 많아 책을 다시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총기 사용이 합법인 데다 정서적으로 우리와 다른 점이 많아 우리 상황에 꼭 들어맞는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15년이나 된 책을 좀더 많은 여성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든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06-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