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쟁
전주성 지음/웅진지식하우스 288쪽/1만 8000원
노무현·이명박 정권서 정책 자문
전주성 교수 ‘한국형 재정’ 청사진
“재난지원금·저출산 등 지출 커져
세금은 정부 권한 아닌 사회 계약
부자과세·선별복지 이념 잣대 아닌
정부의 지속가능 복지 능력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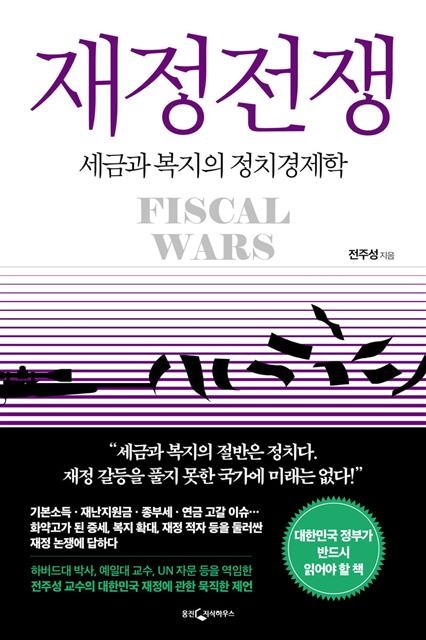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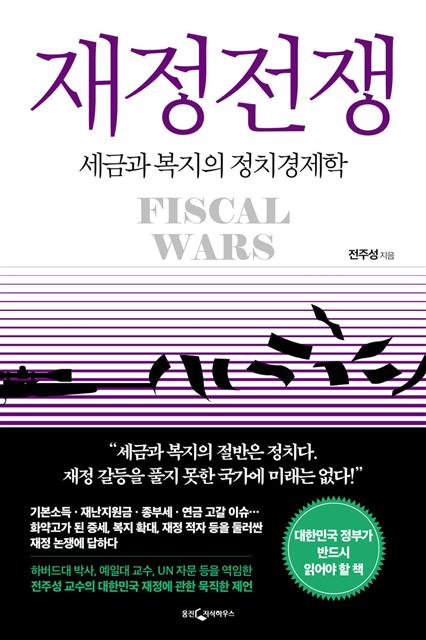
‘바야흐로 재정전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한국재정학회장을 비롯해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등 진보·보수 정권을 아울러 정책 자문을 했던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오랜 침묵을 깨고 낸 첫 책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이전에는 환율을 중심으로 한 통화전쟁이 각국의 경제 성패를 좌우했다면 이제는 재정이 곧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는 뜻에서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 곳간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치밀하고 기민한 전략 대신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에 휩쓸리다시피 재정정책을 꾸려 왔다. 전 교수는 국가 간 경쟁은 물론 국내 갈등마저 극심해진 지금,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국내 활동을 멈추고 10여년간 유엔 지역본부, 워싱턴 싱크탱크 등과 개발도상국의 조세·재정정책 자문에 집중하며 쌓은 통찰을 더해 한국형 재정의 현실을 직시하고 청사진을 내놨다.
여러 방면으로 복지 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하고 그러기 위한 ‘큰 정부’의 필요성이 커지는 추세에서 재정은 정부 정책의 동력 자체다. 하지만 급격한 성장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에도 여전히 선진국과의 복지 격차가 큰 우리나라의 재정 경쟁력은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우선 책을 관통하는 ‘세금은 정부의 일방적 권한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 사이의 사회계약’이라는 기본 원리부터 우리에겐 퍽 낯설다. 그보다 진보는 부자과세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보수는 부자감세와 선별적 복지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념 논쟁이 더 익숙하다.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복지 재원이 필요하니 증세를 해야 한다는 행정편의주의식 조세정책은 ‘누더기 세제’로 비효율과 불신을 부추겼다. 납세자들은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잘 쓰이는지 정보와 믿음이 부족하고 ‘저소득층은 소득세를 잘 내지 않는다’, ‘부동산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등의 굳어진 오해와 편견은 공정한 과세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
책은 복지 포퓰리즘 논란과 기본소득, 종합부동산세나 대기업 법인세 등 부자과세, 연금 고갈과 정부 채무 등 최근 몇 년 사이 정치권과 사회를 들썩인 쟁점들을 촘촘히 따져 보며 각각의 잘못된 관념을 풀기 위한 길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재산이 월등히 많은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대신 그들도 납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 개념을 활용하고, 현금 지원에 치중한 눈앞의 복지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 향유나 사회 후생을 높이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식이다. 소득 대신 소비에 초점을 둬 직장 근로자든 자영업자든 생활 수준을 더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조세 개념을 넓혀가야 한다는 지적도 눈여겨볼 만하다.
전 교수는 기본소득 같은 첨예한 논쟁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는다. 다만 여러 과제를 꿰뚫는 새 정부를 향한 주문은 일관된다. “누가 더 많은 복지를 약속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약속이 지속 가능한 복지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졌고, 따라서 “앞으로 복지정책의 성패는 집권 정부의 이념보다 능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능력 있는 정부’를 꾸준히 요구한다. 그 능력은 곧 납세자들을 존중하고 잘 설득하며 보다 원활하게 과세하고, 단순화한 세제로 낭비를 줄이며 적절한 곳에 지출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을 포괄한다. “세금의 절반은 정치”라는 거듭된 강조가 새 정부에 끊임없이 신뢰를 주문한다.
2022-02-2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