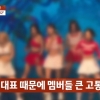회색빛 그 차가운 주검에도 날갯짓한 어린새가 있었다
죽음에도 색깔이 있을까. 억지 같지만 무수한 죽음을 지켜봐 온 나로서는 분명한 색깔을 느끼기도 하고, 예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면서 신체 내부에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다. 그것을 지켜보는 내 마음속에도 체념 같은 공허한 감정들이 물밀 듯 다가온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죽음을 마주하다 보면 역설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분명한 삶의 빛깔을 알게 된다. 죽음에 비해 삶의 빛깔은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무지갯빛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식물원에 갑자기 새가 떨어져 있다기에 가 보니 부화된 지 채 1주일도 안 됐을 성싶은 작은 새 두 마리가 땅바닥에서 버둥거리고 있었다. 차라리 안 봤으면 모를까, 보고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새 두 마리를 소중히 안고 내려왔다.
이런 어린 생명들을 대하면 부담감이 더 커진다. 구조된 것들 중에서 살아나는 것이 극히 드물어 또 하나의 죽음을 예감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다행히 이 새는 먹을 것을 달라고 입을 쫙쫙 벌리는 폼이 삶의 의지가 강한 것 같았다(보통은 두려움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동작조차 못한다).
‘그래 한 번 해 보자!’
그 순간부터 열심히 벌레를 잡아 먹이기 시작했다. 책에서 본 것처럼 이 새도 먹을 것이 어느 정도 위장에 차자 갑자기 뒤를 돌아 하얀 똥을 쭉 내밀었다. 처음에는 입에서 뭔가 튀어나온 줄 알고 놀랐는데 금세 내가 닦아 주어야 할(어미는 다 먹는다)똥이란 걸 알았다. 그렇게 열심히 먹이면서 사흘째 되는 아침, 출근해서 상자를 열어 보니 그 새가 차갑게 죽어 있었다. 온 몸이 회색빛으로 윤기를 잃은 상태였다. ‘모모’란 동화책에서 사람들의 시간을 훔쳐가는 시간도둑들이 회색빛이듯 주검 역시 회색 톤이 강하다. 또 이렇게 하나의 죽음과 마주설 수밖에 없었다.
죽음을 직면할 땐 직업 탓인지 나도 모르게 더 담담해지게 된다. 누가 나처럼 부담을 가질까 봐 얼른 내 손으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한층 더 덤비게 된다.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어떻게든 안 보이게 하고서야 비로소 마음이 안정된다. 남들은 그런 나를 참 무정하고 침착하다고 하지만, 그 순간 내 낯빛도 그 죽음의 빛깔에 전염된 듯 하얗게 질려 있음을 감지하는 이는 드물다.
이런저런 수많은 죽음과 맞닥뜨릴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건 생명 그 자체에 대한 사랑이다. 보통 사람들은 삶에서 무언가 의미를 찾으려고 매일 낑낑대다가 가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면 생을 포기해 버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원초적인 삶에 집착하는 동물들을 지켜보며, 또 이런 죽음의 허무함을 늘 대하며 난 지극히 단순해져 버렸다. 삶이란 그저 이 빛나는 생명의 빛깔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소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2012-01-0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