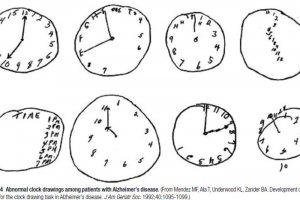‘고령자 조기퇴직제’ 청년실업 해결 못하고 ‘취업 촉진 위한 임금보조 정책’ 재정난 초래
‘일할 권리’를 중시하는 프랑스는 많은 예산을 국민의 고용지원에 사용하고 있고, 관련 조직과 인원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프랑스 정부가 직업훈련에 투자하는 돈만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5%가 넘는다. 하지만 프랑스의 노동정책 성과는 영미권 국가는 물론 유럽 내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역대 정권이 시도했던 ‘개혁’이 번번이 상황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는 프랑스 노동정책을 철저히 반면교사의 사례로 삼아 일부러 반대의 길로만 갔다는 학계의 분석이 나올 정도다. 실패한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정책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구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속적으로 확대된 ‘취업촉진을 위한 임금보조 정책’은 심각한 재정문제로 이어졌다. 프랑스 정부는 장기실직자, 공적부조수급자, 장애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 기업 또는 고용주가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 등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업, 고용주가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 부담이 임금의 40%에 이르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현재 프랑스 정부가 부담하는 임금보조는 GDP의 1.3%에 달하면서심각한 재정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1998년 도입된 주 35시간제 역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당초 프랑스 정부는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레저 등 여가가 활성화되면서 내수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이 정책은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의 원치 않는 시간제 전환이라는 엉뚱한 결과로 이어졌고 프랑스 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사르코지 정부 때부터 이를 39시간으로 환원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사회적 반발로 인해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태다. 난립하는 고용지원 시스템도 문제다. 실업급여 지급은 상공업고용협회가, 취업알선은 국립고용청이, 직업훈련은 국립성인직업훈련협회가 각각 담당한다. 전 세계적인 추세인 ‘원스톱 서비스’와 정반대의 흐름이다.
야심찬 개혁 정책이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는 사례도 많다. 2005년 프랑스 정부는 ‘최초고용계약’(CPE)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경직된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2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고용에 대해 고용보호조항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이나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비견될 만큼 프랑스에서는 획기적인 방안이었지만 대학생 및 노조의 거센 반대로 도입이 좌절됐다.
파리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1-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