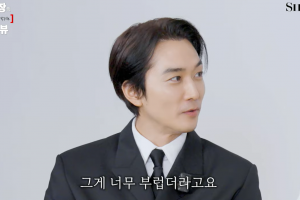재무장관회의로 출발…북핵 등 외교안보 사안은 거의 논의 안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8일(한국시간) 채택한 G20 폐막성명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국제경제문제를 주로 논의하는 G20의 성격상 북핵 같은 안보 문제는 주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G20은 태생 자체가 주요국 재무장관 회의로 출발했다. 1999년 독일에서 주요국 재무장관 회의로 태동한 이후 2008년 미국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계기로 정상급 회의로 격상됐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 관계자는 G20 성명에 북한 도발에 대한 우려를 포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본적으로 국제 경제 플랫폼인 G20 성명에 북핵 관련 내용이 포함되기는 쉽지 않았다.
또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G20 개막 사흘 전이었던 탓에 갑자기 G20에서 외교안보 사안을 논의하고 문서로 담아내기에는 시간도 촉박했다.
다만, 우리 측은 G20 성명에 포함되는 것은 어렵더라도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이 모이는 G20 회담장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이슈를 부각하기 위해 외교역량을 집중했고 결국, 의장국 정상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G20 개막 이틀 전 독일에 입국해 메르켈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도발에 대해 “회원국 공동결의를 담아내기 위해 의장국으로서 관심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메르켈 총리는 “최종 공동성명 채택은 어려울 것이다. 이미 논의주제가 정해져 있는 만큼 비공개 리트리트 세션에서 주요국가 테러리즘 논의 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7일 배석자 없이 G20 정상들만 참석한 비공개 리트리트(자유토론) 세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핵 문제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G20 정상들이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G20 정상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G20 회의 도중 틈틈이 8개 국가 정상 및 2개 국제기구 수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메르켈 총리가 따로 리트리트 세션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참가국 정상들이 큰 우려를 표명했음을 밝히는 성과를 얻어냈다.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G20은 외교정책보다 경제와 금융시장에 관련한 주제에 집중하는 회의지만 리트리트 세션에서 북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됐다”며 “이 문제를 논의한 모든 정상이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참가국 정상들은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의 역할을 지적했다”며 “우리는 모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이번 위반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기를 희망하며 이에 대해 폭넓은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제 경제 관련 최상위 플랫폼인 G20에서 북한 문제 같은 외교 안보 문제를 논의한 것 자체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비공개로 주요국 정상들이 논의한 내용을 의장국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한 것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외교적 성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메르켈 총리가 언론발표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하게 거론함으로써 구두성명과 같은 발표를 한 것”이라며 “형식은 최종 성명이 아니지만, 내용은 우리 입장이 완벽하게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 고위 관계자도 “북한 문제는 사실 유엔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G20에서 논의한 것으로 충분히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외신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G20 성명에 북핵 관련 내용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호주 일간지 ‘더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언’은 9일 G20 결산 기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G20이 경제를 주로 다루는 포럼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불량국가(북한)에 대한 어떤 비판도 사실상 거부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G20 성명에 북핵 문제를 포함하는 것을 반대했는지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거기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결혼 안 해도 가족” 정우성 아들처럼…혼외자 1만명 시대 [김유민의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1/25/SSC_20241125094249_N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