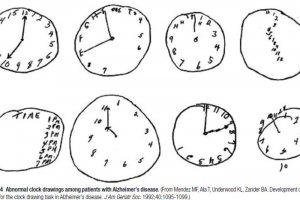‘장자연 편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 발표를 앞둔 가운데 ‘편지 봉투’가 진위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장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전모(31.가명 왕첸첸)씨가 법원에 제출한 ‘장자연 편지’ 봉투 사본은 모두 54장.이 가운데 5장은 동일한 것이다.
각기 다른 50장 중 4장은 소인(消印)이 없다.소인은 동그란 테두리 안에 가운데는 날짜,위쪽엔 발신지(우체국명),아래쪽엔 우체국 고유번호가 들어간다.
나머지 46장 중 15장은 소인에 발신지가 없고,31장은 발신지에 ‘서울’만 돼 있다.서울 동작우체국에서 보내면 ‘서울 동작’으로 찍혀야 한다.서울우체국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봉투 중에 소인의 날짜가 2008년 9월 17일로 돼 있는 것은 우체국 지역명 부위가 가로 1.5㎝,세로 1㎝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려 구멍 나 있는 모습으로 복사됐다.경찰은 이를 조작의 근거로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은 여러 차례 복사하면서 소인 내용이 일부 지워졌을 가능성도 있지만,전씨가 의도적으로 발신지를 숨기려 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체국 고유번호는 7개 숫자로 이뤄지고 전씨가 제출한 봉투는 일부가 지워져 3~4개 숫자만 나오는데 대부분 서울 수유3동 우체국(1420736)의 고유번호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장씨는 직장은 서울 강남이고 주소는 성남 분당인데 수유3동에서 보냈다는 것은 의문이 남는다.
이와 관련해 전씨는 ‘편지 봉투 기재사항’이란 제목으로 재판부에 보낸 자료에서 ‘자연이 후배(여) 동생 거주의 오피스텔<주소 및 우편번호> 생략’이라고 썼다.
장씨의 집이나 직장이 아닌 후배(여) 동생의 주소에서 편지를 보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장씨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려고 재판부에 탄원하며 낸 편지봉투에 장씨의 친필편지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발신지 정보를 뺐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편지봉투 조작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씨는 날짜별로 50장의 편지봉투를 제출했는데 만약 자신이나 다른 재소자의 날짜별 편지봉투를 이용해 이를 조작했다면,수신자와 발신자 등 내용을 없애려고 여러 번 복사를 하는 등의 엄청난 ‘노고’를 들여야 한다.
게다가 전씨의 편지봉투에는 감방번호(예:나 72-1)가 다른 필체로 쓰여 있는데 이는 교도관이 적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모두 전씨의 감방과 일치했다.
수차례 교도소와 구치소를 옮겨다닌 전씨인데 뒤늦게 조작하며 이 부분까지 치밀히 적었다는 것도 설명이 어렵다.
경찰은 입수한 전씨 편지내용에 정확한 장소와 일시가 없는 등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편지봉투의 조작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결정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장자연 편지’의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친필감정의 최고 권위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정에 달려있다.
연합뉴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장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전모(31.가명 왕첸첸)씨가 법원에 제출한 ‘장자연 편지’ 봉투 사본은 모두 54장.이 가운데 5장은 동일한 것이다.
각기 다른 50장 중 4장은 소인(消印)이 없다.소인은 동그란 테두리 안에 가운데는 날짜,위쪽엔 발신지(우체국명),아래쪽엔 우체국 고유번호가 들어간다.
나머지 46장 중 15장은 소인에 발신지가 없고,31장은 발신지에 ‘서울’만 돼 있다.서울 동작우체국에서 보내면 ‘서울 동작’으로 찍혀야 한다.서울우체국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봉투 중에 소인의 날짜가 2008년 9월 17일로 돼 있는 것은 우체국 지역명 부위가 가로 1.5㎝,세로 1㎝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려 구멍 나 있는 모습으로 복사됐다.경찰은 이를 조작의 근거로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은 여러 차례 복사하면서 소인 내용이 일부 지워졌을 가능성도 있지만,전씨가 의도적으로 발신지를 숨기려 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체국 고유번호는 7개 숫자로 이뤄지고 전씨가 제출한 봉투는 일부가 지워져 3~4개 숫자만 나오는데 대부분 서울 수유3동 우체국(1420736)의 고유번호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장씨는 직장은 서울 강남이고 주소는 성남 분당인데 수유3동에서 보냈다는 것은 의문이 남는다.
이와 관련해 전씨는 ‘편지 봉투 기재사항’이란 제목으로 재판부에 보낸 자료에서 ‘자연이 후배(여) 동생 거주의 오피스텔<주소 및 우편번호> 생략’이라고 썼다.
장씨의 집이나 직장이 아닌 후배(여) 동생의 주소에서 편지를 보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장씨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려고 재판부에 탄원하며 낸 편지봉투에 장씨의 친필편지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발신지 정보를 뺐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편지봉투 조작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씨는 날짜별로 50장의 편지봉투를 제출했는데 만약 자신이나 다른 재소자의 날짜별 편지봉투를 이용해 이를 조작했다면,수신자와 발신자 등 내용을 없애려고 여러 번 복사를 하는 등의 엄청난 ‘노고’를 들여야 한다.
게다가 전씨의 편지봉투에는 감방번호(예:나 72-1)가 다른 필체로 쓰여 있는데 이는 교도관이 적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모두 전씨의 감방과 일치했다.
수차례 교도소와 구치소를 옮겨다닌 전씨인데 뒤늦게 조작하며 이 부분까지 치밀히 적었다는 것도 설명이 어렵다.
경찰은 입수한 전씨 편지내용에 정확한 장소와 일시가 없는 등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편지봉투의 조작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결정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장자연 편지’의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친필감정의 최고 권위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정에 달려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