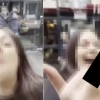“정부 못믿어 … 강제이주 사실 인정하라”
화마가 서울 개포동 자활근로대마을을 덮친 지 1주일, 주민들은 여전히 잿더미 가득한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강남구는 이재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나섰지만 주민들은 이마저도 거절했다. 9년동안의 투쟁으로도 강제이주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구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은 탓이다.●강제철거 우려 임대주택 이주 거부
강남구는 지난 16일 마을 이재민들에게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임대주택을 우선 확보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17일 구의 제안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주민들은 구가 구룡초등학교에 마련한 임시 대피처도 거절한 채 마을회관과 마을 내에 마련한 천막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주민들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거부한 것은 과거의 ‘강제이주’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9년 정부는 도시의 넝마주이와 빈민들을 모아 ‘자활근로대’라는 이름으로 집단 거주하도록 했다. 주민들은 ‘자활 의지를 키워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술교육까지 받았다. 그러다 1981년, 정부는 이들을 전국 각지에 강제이주하도록 했다.
주민들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강제이주 사실을 인정받는 문제가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강제이주 사실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시와 구를 상대로 투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구는임대주택 이주와 강제이주 인정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한다고 해서 강제이주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권익위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전향적인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30년 보금자리 합법적 점유권 달라”
임대주택으로 이주한다 해도 주민들의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다. 주민들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더이상 재활용품을 주워 파는 일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재활용품을 모아두는 야적장을 지금의 마을이 아니면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이 온전한 일부 주민들만 마을에 남을 경우 마을공동체가 ‘해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주민들은 강제이주 사실을 인정받아, 30년 동안 이 마을에 살아온 만큼 합법적 점유권을 인정받겠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땅은 시 소유지이기 때문에 점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06-2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